김범석『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첫 만남, 첫사랑, 첫눈, 처음 학교 가던 날, 첫 월급...,
우리는 대부분 첫 순간을 잘 기억한다.
'처음'의 순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하고 저마다 거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마지막'은 잘 모른다.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음은 늘 지나서야 깨닫기 때문이다.
"아, 그게 끝일 줄 몰랐지" 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것처럼.』
언젠가부터 누군가의 부고를 들을 때마다
그 사람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생각해보는 습관이 생겼다.
마지막 순간의 상황들에는 여러 배경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 내게 가장 쓸쓸하게 느껴지는 배경은 홀로 남겨져있는 병실이다.
뭔가 한 사람의 길고 거대한 역사가 너무나 초라하게 막을 내려버리는 느낌이랄까..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낼 것인가" 라는 질문을 안고 태어난다』
살아가는 동안 각자가 추구하는 삶의 의미를 잃지 않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는 것처럼
죽음에도 삶을 잘 마무리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사람들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기엔 가족들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겠지만
그래도 한때 내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이를 위해
나의 시간과 정성을 소비하는 것은 매우 값진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경제적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돈을 더욱 많이 비축해 둬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
『나를 가장 먼저 돌볼 사람은 나뿐이다.
스스로를 보살필 수 있을 때 남을 돌볼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이 생긴다.
이타적이기만 하려다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해서
다른 사람도 돌보지 못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는 만큼 죽을 때도 정말 잘 죽고 싶다.
오랜시간 요양원에 머물다가 쓸쓸하게 이 생을 마감하고 싶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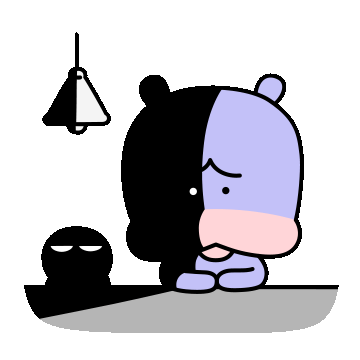
『우리는 죽음만 잊고 사는 것이 아니다.
삶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 있다는 것,
이 삶을 느끼지 않고 산다.
잘 들어보라.
삶을 잊은 당신에게
누군가는 계속 말을 걸어오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종착역에 당도한 이들은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묻는다.
이제는 남아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대답할 차례다.』